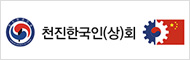[재외동포뉴스] [이희용의 글로벌시대] K-종이접기가 오리가미를 누를 수 있을까
본문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접은 종이학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1980∼90년대 초중고를 다닌 세대라면 작은 색종이로 학을 접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종이학 1천 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말을 듣고 정성스레 접은 뒤 책상 위에 두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했다. 1982년에는 전영록의 노래 '종이학'이 히트하며 유행을 부채질했는가 하면 얼마 전 인기리에 방송된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종이학을 접어 선물하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했다.
종이학을 접는 풍습은 일본에서 비롯됐다. 십장생(十長生)의 하나인 학은 천 년을 산다고 알려져 예로부터 종이로 학 1천 마리[센바즈루·千羽鶴]를 접어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선물해왔다.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사사키 사다코 양은 1945년 두 살 때 원자폭탄 방사능에 노출돼 12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는다. 고등학생들이 그를 문병하며 센바즈루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자 사다코는 간절한 마음으로 학을 접기 시작하고 병원의 다른 환자들도 동참해 며칠 만에 1천 마리를 넘긴다. 그러나 주변의 응원도 보람 없이 하다코는 숨지고 만다. 그 사연이 알려져 종이학 접기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더욱 퍼져나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를 전해 듣고 지난해 5월 히로시마를 방문할 때 손수 종이학을 접어 선물했다.

일본 도쿄의 오리가미회관에 전시된 종이접기 작품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종이학으로 대표되는 종이접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리가미(折り紙)란 일본어로 전 세계에 통용된다. '선'(禪), '인삼'(人蔘), '두부'(豆腐), '바둑'(碁)을 서양에서 각각 '젠'(Zen), '진셍'(Ginseng), '도후'(Tofu), '고'(Go)라는 일본어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종이접기 용어와 방식도 일본이 국제 표준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오리가미란 이름으로 일본식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있다.
40년 전인 1987년 3월 노영혜 씨는 '종이문화 재창조 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그해 10월 한국종이접기협회를 발기해 한국식 종이접기 보급에 앞장서왔다. 1989년 3월 정식으로 한국종이접기협회를 결성한 데 이어 2005년 종이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2010년 'K-종이접기(Jongie Jupgi) 세계화'를 선포했다. 2012년 발족한 세계종이접기연합은 현재 22개국 46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2015년 5월 23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10회 국회 동심 한마당'에서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고깔을 쓰고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이 모델로 삼는 것은 일본의 전통 무술 가라테(唐手)를 누르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다. K-종이접기도 오리가미를 제치고 세계인의 문화로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종이접기연합의 각국 강사들은 태권도가 '차렷', '앞차기', '그만' 등의 우리말 구령과 용어를 전 세계에 통용시킨 것을 본떠 '삼각접기', '학접기' 등 한국식 용어로 지도하고 있다.
종이접기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주는 사료는 전하지 않는다. 역사학자들은 '일본서기'에 "스이코 천황 18년(610년) 고구려왕(영양왕)이 보낸 승려 담징이 종이와 먹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이때 종이접기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무속 신앙에 쓰인 '고깔'을 우리나라 종이접기의 원형이라고 보기도 한다. 안동 봉정사 창건 설화에 따르면 통일신라 초기 문무왕 12년(672년) 의상 대사가 영주 부석사에서 종이로 봉황을 접어 날리고 그것이 내려앉은 자리에 절을 세워 봉정사(鳳停寺)라고 이름 지었다. 조선 초 재상 하륜(1347∼1416)이 만들었다는 승경도놀이도 오랜 종이접기 전통의 증거로 꼽힌다. 막대나 주사위를 굴려 높은 벼슬을 차지하는 것을 겨루는 놀이인데, 관직 이름을 적어놓은 말판을 접는 방식이 고차원의 수학적 원리를 담았다.

2015년 11월 28일 일본 도쿄한국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종이접기 문화 축제 한마당'에 한국과 일본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리가미의 원형도 고대 신앙 풍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에게 기도하며 죄나 부정을 씻는 '하라이'라는 의식에 종이 인형을 접어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이런 의례용 종이접기는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발달해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에 앞서 헤이안 시대(794∼1185) 말기 문인 후지와라노 기요스케가 지은 '청보조신집'(淸輔朝臣集)에 개구리 종이접기에 관한 설명이 있고, 에도 시대(1603∼1867)에는 학·배·개구리 등의 모양을 종이 한 장으로 접는 방법이 70가지나 성행했다고 한다. 일본은 2차대전 후 오리가미를 체계화하고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세계에 전파했다.
종이문화재단 관계자들은 예로부터 한지(韓紙)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데다 각종 유물, 기록, 전통 풍속 등으로 미뤄볼 때 한국이 종이접기의 원류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노 이사장은 "한민족처럼 일상생활에서 종이와 친숙한 민족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도 벽과 천장에 종이를 바르지만 방바닥에까지 종이를 바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한다.

2016년 5월 27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막한 특별전 '종이로 표현하는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종이로 만든 물고기들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오는 11일 설훈·유은혜·김민기 의원실과 종이문화재단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는 '제1회 대한민국 종이접기 역사 포럼'은 우리나라가 종이접기의 원조임을 선언하는 자리다. 의류학자, 민속학자, 수학자, 전통공예가 등이 고깔, 지화(紙花), 백접선(百摺扇·백 번 접어 만든 쥘부채), 승경도 말판, 신위(神位)의 역사와 원리 등을 규명하며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펼친다.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의 이어령 이사장도 한국과 일본의 종이접기를 비교하며 특유의 통찰과 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이접기 원조 논쟁이 양국 간 감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를 추적하고 원리를 파악해 자긍심을 일깨우고 발전의 토대로 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종이접기는 어린이의 두뇌 발달과 노인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종이접기의 원리와 기법은 우주과학과 첨단의학 등에도 쓰이고 있다. 장수를 기원하던 종이학 접기가 미일 간 우호의 메신저 역할을 하듯이 K-종이접기가 새로운 한류의 총아로 부상하고 나아가 한민족의 화합과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heeyong@yna.co.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